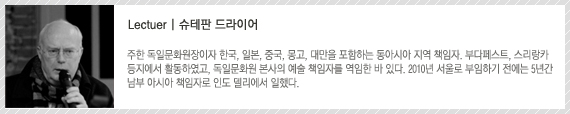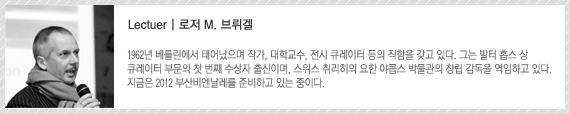공공예술의 꿈
2012-01-06
긴 역사를 통해 볼 때, 예술이 대중을 위했던 적은 없었다. 오늘날을 제외하면 말이다. 오랜 시간 대중을 외면해 왔던 예술은 오늘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아름다움과 혜택을 누릴 수 있을는지 고민하고 있다. ‘공공예술’이라는 말은 이런 예술의 변화를 잘 나타내주는 단어다. 공공공간에서 벌어지는 예술, 공공을 위한 예술은 역사가 짧은 만큼 실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짧은 역사 때문에 더 도전적인 시도가 가능한 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번 ‘디자인으로 사는 세상’에서는 공공예술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이어가고 있는 슈테판 드라이어 주한 독일문화원장과 로저 M. 브뤼겔 2012 부산비엔날레 감독을 만났다.
강연 | 슈테판 드라이어 독일문화원장, 로저 M. 브뤼겔 2012 부산비엔날레 감독
에디터 | 최동은(dechoi@jungle.co.kr)
자료제공 | 문화역서울284
슈테판 드라이어 주한 독일문화원장은 자신이 인도에서 머물며 진행했던 공공예술 프로젝트, ‘48도 공공. 예술. 생태(48°C Public.Art.Ecology, 이하 48도)’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2008년 인도의 수도 델리에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현대예술의 관점으로 도시의 불안정한 생태를 탐구하고자 한 일종의 실험이었다. 이는 델리 곳곳의 공공공간에서 이루어진 예술 작업이었으며, 인도에서 열린 첫 번째 공공예술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특히 그 의미가 컸다.
‘48도’라는 이름은 델리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나타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복잡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델리는 개발중인 다른 도시들처럼 과열된 건설활동, 폭등하는 주가, 그와 함께 파괴되어가는 생태계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델리의 여름 기온을 뜻하는 ‘48도’라는 단어는 산업화와 지구온난화로 동시에 열병을 앓고 있는 델리의 상황을 나타내어 준다.
슈테판 원장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이전에 없던 일이다보니, 정부 유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데만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35개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75개의 허가. 숫자만으로도 그 험난했을 과정이 떠오른다.
또한 인도의 아티스트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일 역시 까다로웠다. 인도에서 활동하고 많은 아티스트들은 인도 정부에 그리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48도라는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냐”, 또 “그리 참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등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격한 반응뿐 아니라 당시 일어났던 불안정했던 치안도 문제였다. 행사 2주 전이었던 2008년 9월 13일, 델리에서 일어난 연쇄 폭탄 테러 사건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가 테러리스트 집단의 테러 대상이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덕분에 행사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 보다 프로젝트 사무국 사람들을 가장 머리 싸매며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은 어떤 타겟을 정하고, 어떻게 행사를 홍보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의미가 커지는 것이 바로 공공예술이기 때문이다.
고민의 결과 세 가지 접근법으로 대중에게 다가서자는 결론이 나왔고, 슈테판 원장은 이 접근법을 담은 동영상 세 편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는 친숙한 이미지로 대중들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영상으로, 일자리를 위해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영상에서 그들은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 파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동영상은 다소 전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인도인들이 반정부시위를 펼치는 주요 장소를 촬영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이 영상은 시위 장소가 정부를 비평함과 동시에, 함께 모인 사람들로부터 생산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복합적인 장소임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동영상은 시민단체와 예술단체가 함께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48도 프로젝트에 참여한 25명의 아티스트 중, 유일하게 시민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 내는 작가의 모습을 담았다. 어떻게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중예술에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는 그만큼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스테판 원장은 3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 보면, 48도 행사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나 사회적인 면에서는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48도 프로젝트가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강연을 끝맺었다.
독일 출신의 큐레이터 로저 M. 브뤼겔은 대중이 진정으로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연을 열었다. 그리고 서울스퀘어에서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는데, 사진 속에서는 안내원의 복장을 한 여성이 한 조각상 앞에 서서 조각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한국인들이 조각에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한국에서는 조각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보다는, 건물에는 무조건 조각상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시 기획자는 이런 미적인 경험을 현대에 잘 적용시켜야 한다. 환경은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이러한 환경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전시 기획자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브라질의 행위예술가 리지아 클락(Lygia Clark)은 예술에 장소를 잘 녹아들게 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그녀는 1967년 한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이 광장은 1964년 군부에 의해 민주화 된 브라질의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작가는 예술을 통해 브라질이 민주화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조국의 대표적인 춤인 탱고를 차용했다. 작가는 커플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옷을 입히고 광장에서 탱고를 추게 했다. 공공장소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작품에 빠져들게 된다. 작가는 이 행위를 통해 “예술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녀는 또 다른 작품 ‘Mascaras sensoriais’를 통해 대상과 대상간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찰했다. 작품에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재미있는 컨셉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1970년대 브라질 군사정부로부터의 해방으로부터 당시의 극복하기 어려웠던 상황들을 마스크를 통해 치유하려는 것이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보고, 듣고, 냄새를 맡는 감각들이 방해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느낌에 훨씬 집중하게 된다. 사실 마스크는 독재 정부가 악용하기도 했던 다소 역설적인 방법인데, 사람들은 마스크를 통해 표면적으로 실체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60, 70년대 아르헨티나의 예술가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비엔날레’라는 이름을 이용했다. 투쿠만은 사탕수수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북부의 지역으로,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는 투쿠만을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현대화된 도시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는 기아가 많고 영아 사산율이 높은 지역이었던 투쿠만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가 조작한 정치활동이었다. 1968년 아르헨티나의 아티스트들은 ‘투크만 아르데(Tucuman Arde)’라는 그룹을 만들어 이 곳에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를 벌였고, 여기에 사회학 전문가와 정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뜻을 모았다. 당시 폐 건물에서 전시를 하면서 투크만 아르데는 주제를 ‘아방가르드 예술의 비엔날레’로 지었다. 비엔날레라는 이름 덕분에 작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였다. 하지만 결국 전시가 시작된 뒤 3일만에 무장한 경찰들에 의해 이 비엔날레는 막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로저 감독은 여기서 비엔날레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비엔날레가 보여주기에 치중하는 행사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비엔날레는 관객과 함께 만들어나가기에는 너무 짧은 준비 기간, 사무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참가 아티스트 등 생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갖고 있다.
로저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엔날레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대중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비엔날레는 단순히 작품을 선보이기만 하는 전시회와는 다르다. 비엔날레는 예술 작품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이고, 여러 조직과 기관들이 만나는 색다른 문화행사다. 참가자도 많아지고 관객들도 많아지다 보니 프라이빗 컬렉터와 대중들간에 작품을 둘러싼 경쟁도 날로 달아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얼마나 유명한 작품을, 많이 전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중들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진정한 참여는 서울스퀘어의 안내원처럼 조각상을 지키고 서 있는 것처럼 공간에 존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시가 시작되기 전부터 차근차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디자인으로 사는 세상(기획: 정소익 도시매개프로젝트 소장)은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에서 진행하는 ‘카운트다운’ 프로젝트의 강연 프로그램이다. 디자인, 건축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디자인과 건축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단순히 ‘디자인 만들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학적인(interdisciplinary) 방법, 다각적인 대상과 연동하는 디자이너와 건축가들과 함께 이들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 사이의 사회, 디자인, 도시의 변화를 읽고 있는지 들어 본다. 또한 공유, 소통, 참여, 자발적 움직임 등과 같은 오늘날의 주제에 대해 이들이 디자인을 접목시키는 방식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강연은 지난2011년 12월 6일 종료되었고, 매거진정글에서는 주요 강연에 대한 리뷰를 몇 차례 연재를 통해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