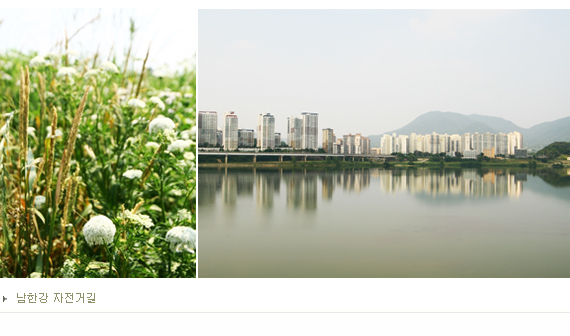돌보는 디자인
2012-07-06
경주 황남동의 어느 담벼락 앞의 오후는 따뜻했다. 갈라진 담장 앞에 장미 한 송이가 피어 있었고, 오후 햇살을 따라 나선 장미 그림자가 벌어진 벽의 틈새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마치 상처 난 곳에 반창고를 붙여놓고 ‘호~’하고 입김을 불어주는 것만 같은 장면이었다.
어릴 적에 배가 아파서 징징거리면, 밤새 엄마가 ‘엄마 손은 약손~’하면서 배를 살살 문질러주었던 기억이 있다. 실제로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저 내가 아픈 것을 엄마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아픈 동안에 내 옆에서 지켜봐 준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쯤은 나은듯한 기분이 들었었다. 담벼락에 드리워진 장미 그림자 또한 물리적인 벽의 틈새를 메울 수는 없겠지만, 마음의 틈새만큼은 충분히 돌보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장미 그림자 반창고와 엄마의 약손. 이렇게 그저 상처를 알아주고 가만히 옆에서 기다려주고 다정하게 어루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고통은 치유되기도 한다.
글, 사진 | 안은희 리코플러스 대표(akkanee@empas.com)
에디터 | 길영화(yhkil@jungle.co.kr)
상처 알아주기
몇 주 전 주말에 ‘남한강 자전거길’을 후배와 함께 잠실에서 미사리까지 쉬엄쉬엄 걸었다. 애초 목표는 양수리까지 걷는 것이었지만, 자전거도 아니고 하루 동안 걷기에는 힘든 거리라는 결론을 내리고 목표치의 반 정도 즈음에서 발걸음을 돌려 세웠다. 그날의 산책은 내게는 일종의 소설에 대한 오마주(?)였다. 코끼리의 오른쪽 앞발이 자신의 심장을 지그시 밟는 것만 같은 ‘고통’을 완화시키고자 9명의 친구를 불러내서 2주 동안 산책을 했던 주인공을 떠올리며,1) 나도 후배를 불러냈다. 그러나 심장이 아픈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후배였다. 그 즈음 후배가 회사를 곧 그만둘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 회사의 다른 후배를 통해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서 힘들었을 거라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후배에게 그 회사를 강력 추천했던 장본인인지라 일종의 죄책감 또는 책임감이 들어서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았다.
1) 김연수, ‘산책하는 이들의 다섯 가지 즐거움’ (<2009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 2009)
묻지도 말고 쓸데없는 조언도 늘어놓지 말고 그냥 걷자, 함께 걸어만 주자는 마음으로 나선 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많이 걸었다. 그저 돌아보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 전하고 싶었다. 산책을 마친 후, 후배의 고통 완화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히려 함께 걷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에 내가 더 따뜻해져서 돌아온 산책길이었다는 것이다. 나도 소설에서처럼 묻고 있었다. “어때(요)? 괜찮아(요)? ‘다음에’ 조금 더 걸어볼까(요)?” 아마도 이런 대답이 돌아왔던 것 같다. “좋아요, 이 길이 좋아졌어요. 남은 길도 다음에 마저 걸어요.” 지난주에 회사를 정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미사리에서 양수리까지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쯤 걷게 될 것 같다.
아물도록 또는 성장하도록 기다려주기
최근에 ‘기적의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서 순천과 정읍을 다녀왔다. 비슷한 시기에 다녀 온 ‘여수 엑스포’와 여러모로 비교가 되는 답사였다. 도서관에서 철학의 ‘생산’을 보았다면 엑스포에서는 기획의 ‘소비’를 보았다. 도서관에서 공간과 디자인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았다면, 엑스포에서는 공간과 디자인 주변을 겉도는 사람들을 보았다. 도서관 곳곳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친구와 놀고 책을 읽으며 편안하게 공간 안에 스며들었다. 건축가(정기용)가 의도하거나 배려했던 모든 공간적 돌봄을 아이들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엑스포에서 사람들은 주제와 공간에 스며들기보다는 스펙타클을 구경하는 관람꾼에 머물고 있었다. ‘(철학적/친환경적)가치’조차 소비로 전락시키는 화려한 장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서 있는 그 장소에서 그곳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었다. 그에 반해 도서관은 소박하고 투박한 공간이었지만 그 장소의 주인은 단연 아이들 자신이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서 어느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만났다. 여름방학을 맞아 그녀는 집에 내려와 있는 동안 자신의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냈던 곳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있었다. 도서관이 개관한지 횟수로 10년. 그녀는 어느새 어린아이에서 훌쩍 어른으로 성장해있었고, 도서관은 그 성장의 시간을 함께 해왔다. 아마도 세상의 모든 성장이 그러하듯이 그 시간들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진통 없는 성장이 없듯이, 세상이 자기 안에서 부글거리며 끊는 아픈 성장통을 겪으며 한 소년/소녀는 한 어른이 된다. 그 길고 긴 성장의 시간들을 함께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공간, 그것이 아마도 건축가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음 형태이지는 않을까. 도서관 답사에서 어렴풋이 들은 것도 같다.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건축가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가 엄마가 되어서 다시 자신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소리도.
가꿈으로 서로 돌보아주기
‘디자인(design)’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고 조율하여 대상을 가꾼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에 디자인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자연, 자연과 마음을 이어주는 작업이어야 한다. ‘디자인리베로(DesignLivero)’가 디자인한 화분겸용 식기건조대는 꾸미고 돌보는 관점으로 사물과 관계를 해석한 제품이다. 접시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모여서 꽃을 피우는 모습은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에코의 정신이 저 멀리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보고 가꾸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일상에서 환기시키는 장면이기도 하다.
고(故) 박완서 선생님의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에 보면, 맨손으로 흙을 주무르다가 외출하여 때 묻은 까만 손톱을 감춘 채 상상하시는 이야기가 나온다.
「며칠만 나의 때 묻은 손톱을 간직하면 열 손가락 손톱 밑에서 푸릇푸릇 싹이 돋지 않을까. 내 손톱 밑에 낀 것은 단연 때가 아니라 흙이므로.
매니큐어 대신 손끝에 푸른 싹이 난 열 손가락을 하늘 향해 높이 쳐들고 도심의 번화가를 활보하는 유쾌하고 엽기적인 늙은이를 상상해본다.」 - 박완서,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 현대문학, 2010, pp.17~18
선생님의 말씀대로 웃음이 비죽비죽 새어나오며 유쾌해지는 묘사였고, 생명을 가꾸는 이만이 느낄 수 있는 푸르른 생기가 넘쳐나는 상상이었다.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이 치장하는 꾸밈이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아름다움이라면, 푸른 싹이 돋아나는 손톱은 존재적인 돌봄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다.
아마도 황남동의 갈라진 벽을 어루만지던 장미그림자가 아름다웠던 까닭도 돌봄이 주는 치유의 따스하고 자연스러운 온기가 느껴져서 일 것이다. 자신이 돌보는 한 뼘의 땅이 지구 전체를 가꿀 수도 있다는 관계의 확장,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라서 자신이 받았던 돌봄을 되돌려주는 순환의 법칙에 대해 생각해본다. 세상은 너무나 상호적이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디자인이 돌보아야 할 대상은 너무도 많다.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색’이 있었다. 색으로 빛나고 있는 그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한다. 허름하고 좁은 골목, 남의 집 대문과 같은 장면들은 우리들의 눈과 귀를 머물게 한다. 우리의 눈에 의해 포착되어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의 의미로 포획되어 버린 장소 이야기, color of village는 그런 장소와 장면들의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