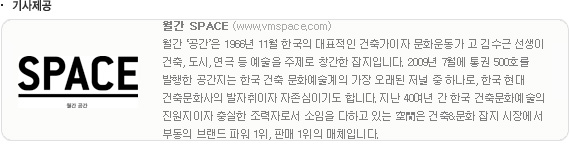제1회 서울 레코드페어 관람기
2012-01-04
교복을 입긴 했지만 공부와는 거리가 멀던 학창시절, 대형음반매장과 광화문, 청계천에서 음반을 구경하는 건 거의 유일한 ‘취미생활’이었다. 차비가 없으면 1시간을 걸어 음반매장을 찾았고, 음반 살 돈이 부족할 때면 점심을 며칠 굶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꿈꿔온 ‘돈 버는 직장인’이 된 이후 지금도 매년 1~200장의 음반을 사고 있지만, 1년에 10장 사는 것도 버거웠던 시절에 구입한 음반들만큼 소중하게 다루진 않는다. 음반의 겉포장을 조심스럽게 뜯고, 부클릿을 보며 오디오로 첫 곡을 플레이할 때 짜릿함을 느끼는 건 여전하지만 말이다.
글 | 윤태호 VMSPACE 에디터
그렇다.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음악과 음반을 사랑한다. 지난 11월 19일에 열린 ‘제1회 서울 레코드페어’는 친한 친구의 결혼식처럼 꼭 가야함과 동시에 두툼한 지갑도 필요한 행사였다. 추가로 반가운 얼굴들을 오랜만에 볼 수 있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정오를 지나 행사장인 논현동 플래툰 쿤스트할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공간이 다소 비좁기도 했지만) 부스를 이동하는 게 쉽지 않을 만큼 북적였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비틀즈(The Beatles)와 핑크 플로이드(Pink Floyd)의 박스세트가 보였다. 익숙한 음반 레이블 부스와 오피셜 머천다이즈 브랜드인 브라바도, 음향기기 전문업체 젠하이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오프라인 음반매장을 가지고 있는 핫트랙스의 부스도 보였다. 레이블에서 나눠주는 기념품들을 챙기며 본격적인 관람도 시작됐다. 고속 스캔을 하듯 눈이 빠르게 돌아갔다.
사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조용히 음반 찾는 게 익숙하고 온라인 구매도 많이 하는 음악 애호가 입장에선 입장료를 내고 음반을 구경하는 이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입장이 가능했던 얼리버드 티켓의 메리트가 약했다는 의견도 있다. 확실히 깐깐한 컬렉터들을 만족시키기엔 부족했다. 판매 중심이었지만 전시와 공연이 어우러진 음악 이벤트였고, 휴대용 플레이어와 음원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턴테이블과 음반은 신기한 볼거리였다. 많은 사람들이 레코드의 매력을 발견하길 원했던 만큼 1회 행사는 대중적 공감대를 필요로 했다. 첫 행사였던 만큼 ‘마니아들을 위한 축제’로 기획하는 건 더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음반이 외면 받는 시대에 음반을 메인으로 내세운 행사를 갖는다는 건 일종의 모험이니까.
결과적으로 제1회 서울 레코드페어는 성공했고, 2회를 기약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 컨텐츠와 장소 말고도 개선됐으면 하는 것들이 보였다. 한 가지 아쉬웠던 예를 들자면, 레코드페어 이름을 건 ‘추천음반’ 내지는 ‘기념음반’이 없었다는 것이다. 음반 구경과 구매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행사인 만큼 단순한 입장권 판매를 넘어선 다양한 옵션이 필요해보였다. (입장권 산 게 아까워 어쩔 수 없이 앨범 몇 장 샀다는 얘기도 있었다) 오후 3시 이후부터 이어진 공연은 즐거웠지만, 행사장에 오래 머무르기 힘든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공연이 시작되면서부터 판매자와 관람객의 소통이 어려워진 것 또한 아쉬웠다. (앨범 추천을 받고, 중고음반 가격 흥정을 하는 소소한 재미를 즐길 수 없었다)
개인적으론 비트볼, 일렉트릭 뮤즈 등 인디레이블과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음악들을 수입해서 소개하는 전문 레이블 부스가 반가웠다. 많은 앨범을 손에 넣진 못했지만, 좋은 앨범 하나를 추천받기도 했다. 오리지널 LP 전시와 아티스트 이정선 특별전도 반가웠다.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내심 이런 행사들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요새는 잘 모르는 사람이 오랜만에 시디 한 장 샀다는 얘기만 들어도 반가우니까. 이 글을 쓰며 나는 또 오늘 도착할 시디를 기다리고 있다. 언제쯤 철이 들지 잘 모르겠다.
http://recordfair.kr